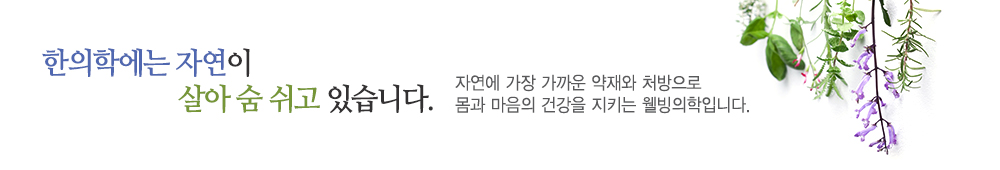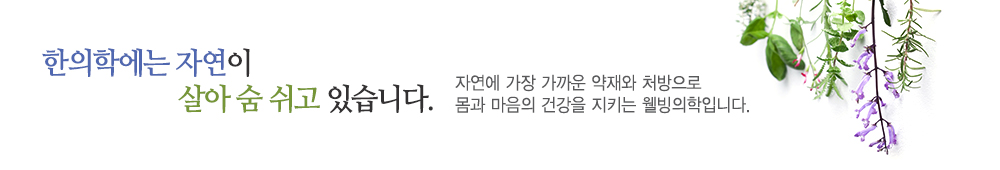어르신의 양생방법: 노인병학
무병장수의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과 휴식이다.
노인병을 대할 때는 수면과 위장을 먼저 살핀다.
황제내경에서는 노화와 노인병을 걱정하기보다는 무병장수가 가능함을 먼저 말한다.
상고천진론에서 말하기를,
“먹고 마시는 것에 절도가 있고, 일상생활과 수면이 적당하며, 괜스레 정신을 허비하지 않으면 신체와 정신이 온전하여 天壽를 다 누리고 백세를 넘겨서 비로소 간다”고 하였다.
(食飮有節 起居有常 不妄作勞 故能形與神 俱而盡終其天年 度百歲乃去)
(식음유절 기거유상 불망작노 고능형여신 구이진종기천년 도백세내거)
또 말하길,
“헛된 것, 삿된 것, 도적, 바람(육기와 유행풍속을 말함)을 항상 피하도록 하며, 편안하고 담담하고, (잡념이나 집착을)비우고 없애면 眞氣(생명력)가 순조롭고 정신이 안에 든든히 지키고 있으니 병이 어디를 쫓아 오겠는가!”라고 하였다.
(虛邪賊風 避之有時 恬憺虛無 眞氣從之 精神內守 病安從來)
(허사적풍 피지유시 할담허무 진기종지 정신내수 병안종래)
우리 주변에서 上老人 분들이 잠결에 돌아가시는 것을 더러 본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의 “오래된 미래”에서는 라다크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는 내경에서 말하는 분위기가 물씬 느껴진다. 오전에 마을을 지나다가 아는 할아버지가 지붕수리하는 걸 보고 인사를 건넨다. 오후에 다시 그 마을을 지나오는데 상이 났다고 하여 들어가 보니 그 할아버지께서 자연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의료를 보면 더 재미있다. 환자가 워낙 없어서 의사들이 개업을 못하고 평소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환자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사실은 제가 의산데요’하고 나선다고한다.
척박한 지역이라 양식이 한해 먹기에 빠듯하거나 좀 부족하다. 그러면 겨울에 늙은 야크로 부족한 식량을 대체한다. 그런데도 매일 축제분위기라고 저자는 말한다. 라다크 사람들 말 가운데 가장 센 말이 ‘너 화났니?’라고 한다.
무병장수를 위해서 내경에서 제시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결국은 규칙적인 생활과 휴식 정도이다.
恬憺虛無라하면 우리는 대단한 마음수양으로 생각하고 일반인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육체의 과로를 조심하고, 정신이 많이 시달리지 않도록 생활한다는 것은 적당히 휴식할 줄 안다는 것과 같은 말이지만 누구나 하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좀 더 쉴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50대 후반의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선생님이 어깨가 아파서 내원하였다.
한쪽 팔이 반밖에 들리지 않고 뒤로 젖히면 아파서 옷 갈아입기가 불편하며, 특히 잘 때 어깨통증으로 힘들어한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수개월 받았으나 차도가 없다고 한다.
침과 격강구를 이삼일 간격으로 서너번 했더니 좀 낫다고 하더니만, 며칠 후에 다시 와서는 또 꼭 같아졌다고 한다. 그래서 휴식이 부족한거 아니겠느냐고 했더니, 잠도 그 정도면 충분하고 스트레스도 없으며 업무도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약으로 어깨조직을 튼튼히 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정밀검사를 한번 더 받아볼 수도 있으니 생각해보시라고 하였다.
일주일 후에 이분이 진료확인서를 끊으러 내원하여 다 나았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다.
삼일간 결근계를 내고 집에서 마음껏 자고 푹 쉬었더니 팔이 쑥 올라가더라는 것이다.
이분이 아프게 된 것도 생활의 피로였고, 그간 낫지 않았던 것도 피로를 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게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각종 질병이나 증상의 원인을 가만히 보면 대개는 휴식부족일텐데, 문제는 그분들이 휴식이 부족하다고 까마득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나, 이 정도는 견딜만하다고 자신하고 있거나, 휴식을 한다고 쉽게 나아질 걸로 믿지 않는데 있는 것 같다.
이런 예는 많을 것이다.
잠자기를 아까워하는 사람들, 식사를 건너뛰었다가 폭식했다 하기를 여반장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료이전에 잠을 최소 7-8시간으로 늘리고, 식사를 잘 챙겨서 1-2주일간 생활한 뒤에 치료를 시작하면 더욱 좋다.
정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분은 약을 처방하면서, 가급적이면 잠과 식사를 최대한 챙겨보라고 다짐하듯이 권한다.
몸을 쉬기는 그리 어렵지 않지만 마음을 쉬는 것은 확실히 어렵긴하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잠 아닌가? 잠을 잘 때는 보고 듣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쉬므로 우리의 정기신(精氣神) 또한 제대로 휴식을 한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하던 사람도 잠을 푹 자면 머리가 훨씬 개운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끼며, 이럴 때 질병회복에 크게 이로울 것이다.
노인병을 대할 때도 이와 같이 수면과 위장을 우선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대개 노인은 기혈과 정기신, 진액과 정혈, 장부경락과 피혈육근골 모두가 부족하여 여러 증세가 생겨나기 쉽다.
그래도 식사라도 어느 정도 하시고 잠을 잘 주무신다면 문제가 적지만, 위장이 약하여 입맛이 없거나 한번에 많이 못 드시며, 시간이 지나면 또 허기가 나고, 조금만 더 먹으면 소화가 안된다고 한다.
수면장애를 느끼는 분들도 많아서 자주 잠을 깨며, 소변때문에라도 잠을 오래 주무시지를 못한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증상도 잘 낫지 않고 더 허약해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러므로 약을 쓸 때 정수(精水)도 도와야겠지만, 반드시 위를 도우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가 편해야 잠도 나아진다. 위가 약한 분들은 현미와 잡곡에 부담을 느끼므로 반드시 백미로 소화를 돕도록 한다.
노인이 잠이 적다는 것은 다 그런게 아니다.
무병장수하는 분들은 잠도 많이 주무시는게 통계에 나온다.
젊은 사람보다 활동을 적게 해도 더 쉽게 피로를 느낄텐데, 그 피로를 풀자니 잠이 많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잠이 적다고 하는 것은 기운과 영양이 부족하고 애를 계속 썼던 수십년 동안의 습관 때문 일 것이다.
잠이란 낮에 활동하던 기운을 거두어 쉬는 것이다.
그런데 기운이 적으면 거두는 기운도 적다. 이것이 陽衰不寐(양쇠불매, 양이 약해져서 잠이 없다)이다.
또 노인은 대개 영양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운의 안정이 덜 되어서 자연히 부실하게된다.
거기에다가 노인이 되면 여러모로 뒷전이 되어 섭섭함과 억울함, 불평불만이 많아지므로 기운이 더 부실하게 되어 위로 떠서 말수는 좀 많아지고 잠은 잘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절통 등의 증상에 대한 약보다는 식욕이 돌아오고 잠을 잘 주무시도록 처방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노인병학(geriatrics)은 현대에 와서 수명연장과 함께 새롭게 연구되는 학문이다.
그러나 황제내경의 관점을 참고한다면, 휴식하는 데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천수를 다 하거나 최소한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아파서 온갖 고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인은 이전에는 지혜와 이치에 밝고 너그러우신 어른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았고, 그때에는 치매가 있긴 했으나 아주 드물었다.
요즘 들어 노인은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가 된 듯하다. 치매가 급증한 것도 가족제도의 변화와 개인주의의 영향이 많을 것이다. 다른 질환들도 비슷하다.
미국배우 브래드피트는 젊은이들이 부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나이는 지혜를 주므로 젊은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최근에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대우받고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회복하는 것이 노인병학의 방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